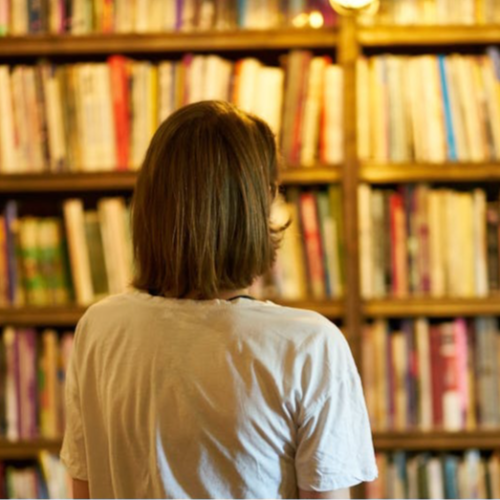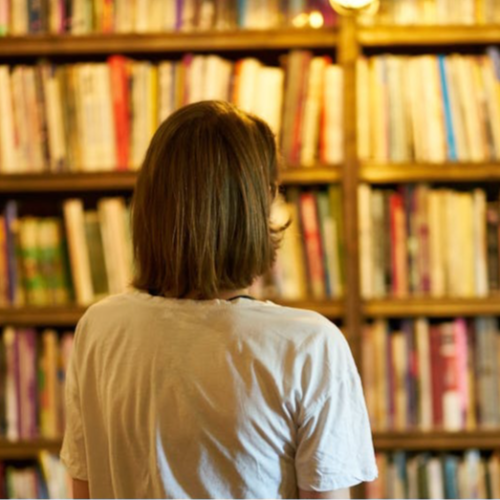오늘은 짧은 편지.
요즘은 책을 거의 읽지 못하고 지내요. 올해 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책 읽는 방법을 잊어버린/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선은 일에 몸을 끼워맞추는 데 집중하며 지내고, 독서모임을 하는 책만 겨우 읽고 있어요.
『그대의 차가운 손』을 읽은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네요.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종일 몸 생각을 했어요. 몸이란 무엇일까.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당연히 없음), 나는 얼마만큼이나 몸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 책 속에는 L과 E와 H, 이렇게 대문자 이니셜 뒤에 가려진 세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그들의 몸 이야기가 제 인생의 다른 지점들과 각각 연결되어서 그 몸과 제 몸, 몸들이 겹치는 장면들을 오래 쥐고 있었어요.
L에게 몸은 아마도 감옥. “평생 못 달아나. 죽을 때까지 난, 내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내 몸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니까.”(p.178)라고 말하는 L의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무겁게 말하면 계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기억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보다도 냉정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평가하게 되는 건 L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E는 몸을 도구처럼 여겨요. L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E는 이미 그 모든 방황을 끝내고 자신만의 확고한 답을 찾은 모습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섯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한 이후로 자신이 ‘비정상’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몸을 외투 삼아 단단히 준비합니다.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몸매와 얼굴,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과 뛰어난 사회성을 갖춘 E는 도구로서 몸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에필로그에 이르러서 H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 그 답은 질병이다. (…) 예기치 못했던 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거리에 나오면, 이 사회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p.320) 짧은 서술을 통해 H가 병동에서 한 달을 입원할 정도로 아팠고, 이후 집에서 회복기를 거치며 사회에서 배제된 위치를 감각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H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책이 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아팠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문득 다시 읽어보니 어쩌면 정신이 아팠던 걸까? 싶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몸이든 정신이든 어디가 아팠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결국 정신도 영향을 받고, 정신이 아파도 몸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L도, E도, 각자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몸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처럼요.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는 제목에서 ‘손’ 자리에 ‘몸’을 넣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의 흐름이 여기까지 오니 ‘몸’ 대신 ‘정신’이나 ‘마음’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대의 차가운 손’은 ‘그대의 차가운 손/몸/정신/마음’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펼쳤다가, 이번 레터는 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마음 먹었는데. 몇 번을 썼다가 지웠어요. 이대로는 반달이 뜨는 밤을 놓칠 것 같아서 오늘은 편지로 갈음하려고 해요.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가 있고 몸 이야기도 그 중 하나겠지요.
한강 작가 전작 읽기 독서모임을 진행하면서 한 권에 두 편씩 레터를 써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새 <그대의 차가운 손>까지 왔네요. 다음 레터는 상현달이 뜨는 6월 3일에 발송되고요, <채식주의자> 이야기를 담아볼게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참 좋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해요. 그때까지 손/몸/정신/마음 잘 챙기고 만나요!
2025.05.19.
하루 드림
|